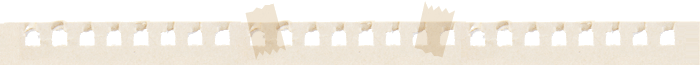[태연정인] Two Different Tears. (愛와 哀)
w. VIVACENDO
툭, 투둑.
어느새 맑았던 하늘이 여물고 빗방울이 도로를 물들이기 시작한다. 급격한 소나기, 그저 한낱 여우비도 아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나기. 그칠 기미는 없어 보였다. 오늘 일진이 왜 이러지, 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한숨이 조용히 다락방 안에서 잠시 울렸다 사라진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비를 바라만 보고 있자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인 것일까. 이미 곧게 펴져 깔끔한 머리카락 몇 가닥을 꼬아 비비던 그녀는 끙, 하고 무릎을 짚으며 일어섰다. 머리가 닿을랑 말랑한 눅눅한 갈색 원목 천장은 하늘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는지 삐그덕거리며 내려앉을 듯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고개를 들어 말없이 바라보던 정인은 한 쪽 입꼬리를 올려 피식 웃었다. 낡았구나, 너도, 나도.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다락방은 무척이나 편리했다. 한쪽에서 잠그면 다른 쪽에서는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정인이 찾던 곳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다. 자그마한 창문 두 개가 있는 이 다락방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안에서 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거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녀는 이곳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편했다. 남에게 자신의 마음 따위 들킬 일은 없었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정인은 발걸음을 옮겨 녹이 슨 자물쇠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산지 몇 년. 당신과 헤어진지 몇 년. 눈가에 약한 주름이 잡히며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멈춰서 고민했다. 삼년? 사년? 오늘이 며칠이지? 아니, 오늘이 무슨 달이지?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판단되자 정인은 입김을 위로 불어 올려 지저분하게 흐트러진 앞머리를 다시 한 번 헝클어 놓았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자식의 얼굴은 잊혀지지 않으니까, 하고 속으로 끝맺음을 지분거리고 다시 철 자물쇠로 시선을 옮겨놓았다. 분명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네 얼굴은 내 속에서 변하지 않겠지.
조폭 출신 아버지에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 딸- 아이러니한 조합이라고 수근거렸다면 좋았으련만. 모든 이들은 '특이하다'라기 보다는 '이상하다'라고 단정지어버렸다. 그 덕에 몇 번이나 날카로운 화살촉이 파고 들어가 깊숙히 상처를 세겨놓은 정인의 심장은 그 누구의 것보다도 단단한 갑옷을 싸매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인은 자비를 베풀어줄 생각 따위 가지지 않았다. 나는 나니까, 너는 너고.
한참을 멍하니 회상하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비가 멈췄는지, 그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 앞이 뿌옇게 번진 후였다. 어이없는 실소를 내뱉고 다시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자물쇠를 몇 번 돌린 뒤 그녀는 눈을 살며시 감아 슬픔을 가둬놓았다. 그녀가 항상 그랬던 것 처럼, 가둬놓았다. 안구건조증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소원을 밤하늘에 조곤조곤 빌었던 것도- 이제는 3년? 4년?
철컥, 하고 무겁기만 한 자물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시에 정인은 걷어올린 소매를 다시 내려놓고 방울지어 내려앉을 준비를 한 물을 걷어내었다. 뭐가 억울하다고 울어, 유정인. 넌 원래 이랬잖아. 조폭의 딸, 아니, 이제는 죽어버린 조폭의 딸, 유정인. 너를 평생동안 쫓아다니던 이름이잖아.
그러나 정인은 알고 있다.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 그 당연한 상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자신을 조폭의 딸이지만 이상하게 검사인 유정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끔은 따뜻하게, 가끔은 냉철하게 유정인, 이라고 불러주던 그의 목소리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본능적인 느낌. 아, 나의 사람. 나만의 사랑. 나의 사치.
떨어진, 추락한, 어쩌면 겉보기에 볼품없는 자물쇠. 잠시 시선을 두다가 고개를 두어 번 젓고는 마지막으로 문 손잡이에 차가운 손을 얹어놓았다. 쓸데없이 시적이야, 입술을 달싹이며 지긋이 창 밖 풍경을 바라본다. 역시나, 비는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다. 집 밖 심어진, 몇 백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커다란 고목나무의 잎의 끝자락에 고인 빗방울은 몇 초- 아니 몇 초도 되지 않은 시간에- 도 지나지 않아 모든 애(愛, 哀)와 함께 쓸려내려간다. 이제 얼마 못 버티겠구나, 하고 이상하게 목이 울렁거림을 느낀 정인은 서서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아, 나의 사람. 나만의 사랑. 나의 사치.
나의 슬픔(哀), 나의 사랑(愛).
하염없이 밝은 날에 슬프고, 어두운 날에 기뻤던 날들,
그 지난 날들에 표하는 두가지 눈물.
fin.
'NOV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랑 조각 (0) | 2014.09.23 |
|---|---|
| 별에서 온 그, 별난 그-01 (0) | 2014.03.31 |
| 뱀파이어검사와 별에서 온 그대 크로스오버 팬픽 (0) | 2014.02.24 |